노동은 시대를 불문하고 자리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양식이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동시에 욕구를 지연시키기도 하며 타인과 매개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한다.
이러한 노동이라는 활동을 다룬 철학은 ‘사회철학’ 부류에 속한다. 개인과 집단의 봉합과 화해를 주축으로 한 사회철학 속에서 ‘노동’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한 세 명의 철학자(J. 로크, G.W.F 헤겔, K.맑스)가 존재하는데, 각각이 ‘노동’이라는 활동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_존 로크, 사적소유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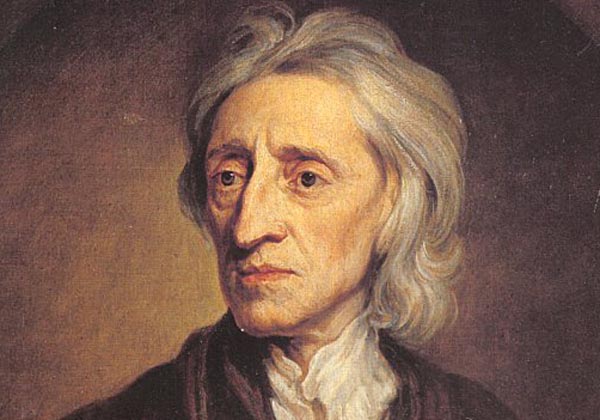
존 로크는 ‘고전적 사회계약론’의 대표주자로 『리바이어던』 을 기술한 ‘토마스 홉스’, 『사회계약론』을 기술한 ‘장 자크 루소’와 함께 거론되는 사회계약론자이다. 이들의 목적의식은 자연상태의 각인들을 어떻게 사회와 국가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탐독하며 사회와 국가의 철학적 정당화를 위한 사변적 이론들을 펼쳤다. 고등학교때 익히 배웠듯 세 학자가 정의하는 자연상태는 각기 다르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그 자연상태 속 개인들을 사회적 존재로 전화시키는지는 상이하다.
여기서 로크는 사회계약의 근저에 ‘사적 소유’가 존재함을 지목한다. 다시 말해 비교적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자연상태에서 사적 소유가 등장하며 개인들간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노동’의 컨셉이 언급된다. 사적 소유를 만드는 것은 다른 아닌 ‘노동’이라는 행위이며 그 행위가 사적 소유를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제로 여기 저기 편재해있는 자연대상에 나의 구체적인 노동(무질서한 자연을 가공하고 변형시키며 전유하는 활동)을 통해 변형된 자연물이 나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개인들간의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로크는 ‘노동’을 자연상태 속 사적 소유를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노동을 통해 형성된 사적 소유를 담지하여 이를 지켜내고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간의 ‘계약’이 치뤄져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_헤겔, 자연으로의 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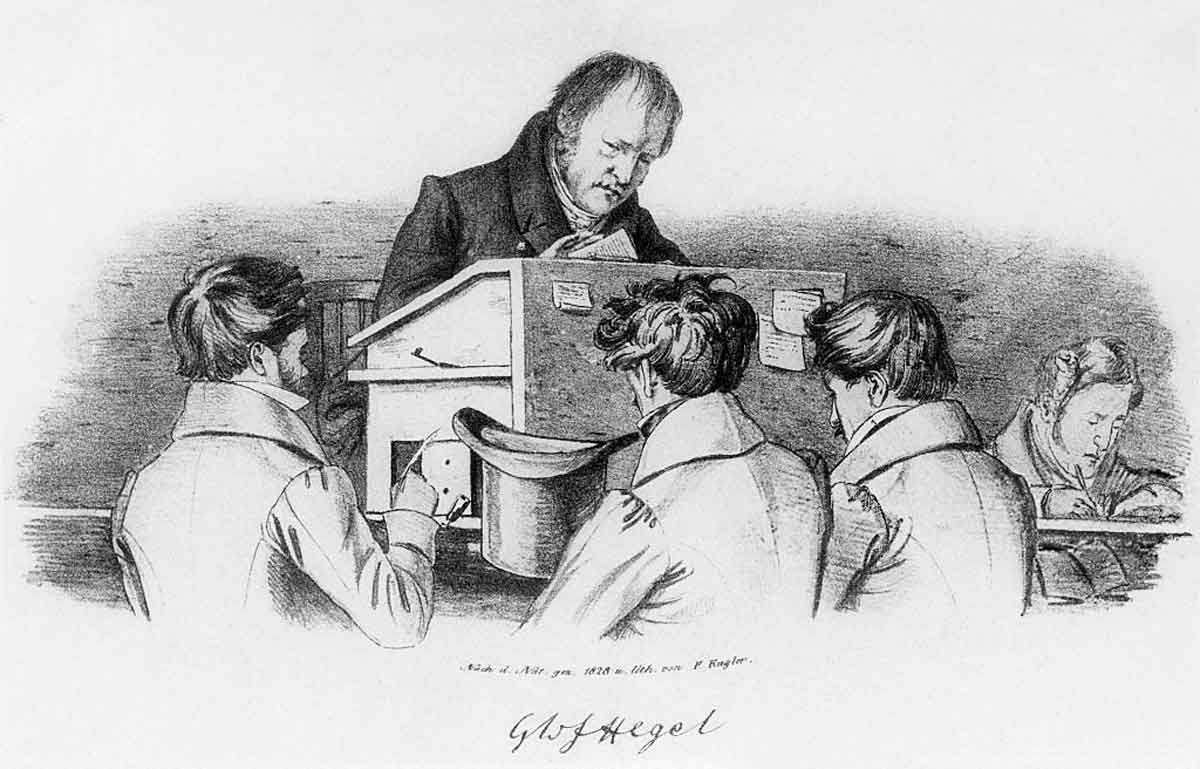
헤겔은 로크의 노동 개념을 지양Aufheben해온다. (지양이란 변증법적 개념으로 1.원래의 것을 폐기하거나 2.보존하며 3.동시에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선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헤겔의 노동 개념은 『정신현상학』의 그 유명한 ‘주노 변증법(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주노 변증법을 통한 노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등장이 필요로 하다. 인간의 등장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프랑스 인권 선언’과 함께 등장한다. 즉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개인’이라는 법인의 등장이 인간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헤겔은 이 지평에서 시작한다. 각각의 개인을 욕망하는 자기의식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욕망하는 자기의식들이 충돌했을 때 ‘인정 투쟁’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지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인정투쟁에서 두 명의 욕망하는 자기의식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한다. 이 투쟁에서 ‘죽음을 택한 자(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자)’가 ‘생존을 택한 자(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가 생겨나고 전자는 투쟁의 승자로 후자는 투쟁의 패자로 전락하며 이 과정에서 헤겔은 승자가 더욱 고양된 이성, 즉 ‘인간적 이성’을 지녔으며 패자가 더욱 자연적 이렁, 즉 ‘동물적 이성’을 지녔다 논한다.
인정투쟁이 끝난 후에도 승자는 패자를 죽이지 않는다. 승자의 욕구는 투쟁이 끝나도 지속되기에 패자를 노예로 삼아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형성된다. 여기서 헤겔은 ‘노동’이라는 활동을 노예의 활동이라 규정하는데, 투쟁에서 진 노예는 주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위험하고 거친 자연으로 나아가 그를 탐독하고 변형하고 개조해야 한다. 예컨대, 주인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노예는 주인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사냥이나 도축을 하여 주인에게 고기를 대접하는 것이다. 노예가 행하는 노동은 살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노예의 이성을 인간적 이성으로 도야Bildung(고양) 시키는 행위이다.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노예를 처벌하거나 죽일것이고 그렇기에 노예에게 노동은 삶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동시에 노예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지연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변형시키고 개조하는 능력을 익혀가며 정신을 성숙시킨다.
다시 말해 관념론자인 헤겔에게 있어 노동은 자기 자신을 자연이라는 대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즉 ‘외화’이다. ‘나’로 정립된 주체가 내 관념에서 나와 자연대상과 마주하고 다시 ‘나’의 관념으로 복귀하며 정신과 이성이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노동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자신을 외화시키는’ 행위이며 헤겔에게 인류사 전체는 ‘소외의 역사’라는 것이다.
_맑스, 소외된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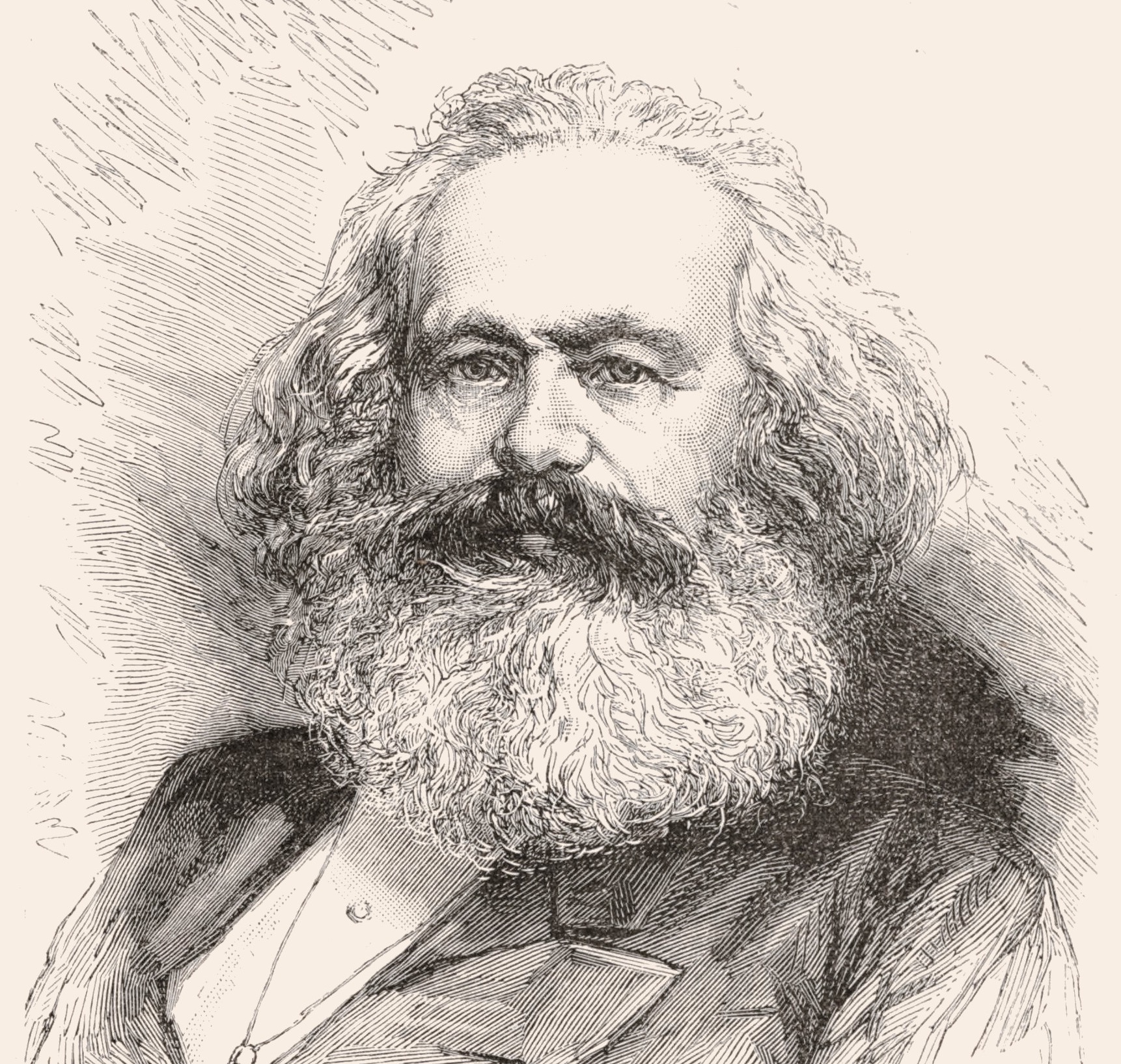
맑스(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다. 맑스에게 또한 노동은 ‘자연과 인간의 합목적적 물질대사’이다. 즉, 노동은 인간이 자연대상과 관계맺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헤겔이 노동의 긍정태를 바라봤다면 맑스는 노동의 부정태를 바라본다. 더욱 정확한 맑스의 지적은 ‘헤겔은 자본주의 시민사회’라는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맑스는 여기에 감성적 유물론자인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을 더한다. ‘유적 능력’이란 인류 전체가 지닌 무한한 능력을 뜻한다. 즉 맑스의 노동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지연시키는 개인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인류 전체의 무한한 능력의 축적을 실현시키는 행동이기도 하다.
예컨대,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 노동 행위는 ‘나의 사유와 언어들을 글로 적어서 보존’하려는 나의 욕망이 투영된 동시에 연필을 만드는 과정과 기술은 오로지 나의 사변적이고 경험적 능력에서 도출된 값이 아닌 ‘인류 역사의 축적’에 의해 산출된 과정과 능력들이다. 다시 말해 석탄이 흑연으로, 흑연이 다시 연필로, 더 나아가 연필이 샤프로, 여기서 더 나아가 샤프가 애플펜슬로 진화하는 과정은 ‘나’의 개인적 능력보다는 인류 전체의 ‘유적 능력’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허나 맑스는 자본주의 시민사회 속 이러한 노동의 긍정태를 목격하지 못하며 ‘소외estranged’된다 표현하는데, 여기서 맑스의 소외는 헤겔의 소외(외화)와는 달리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에 있어 우리는 개인적 능력과 유적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그저 ‘가치’ 즉 ‘값어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물신화된 자본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인류사가 진화한 것 처럼 노동에 대한 논의도 진화해왔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평에 서서 노동을 행하고 있는가. 아마 맑스의 논의에 근접하지 않을까. 인류의 유적 능력은 계속하여 발달되고 그 덕에 자본주의는 충분히 성숙해졌다. AI의 등장, 노동일의 변화, 노동 양태의 변화 등 노동 활동을 둘러싼 지속적인 변화가 현재 우리 삶의 근저에 놓여 있기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